국가 안보를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사 칼럼입니다. 총과 전선, 군사 전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안보의 이면을 탐색합니다. 전쟁과 분단, 국방과 보훈의 문제를 단순한 정책이나 수치가 아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과 윤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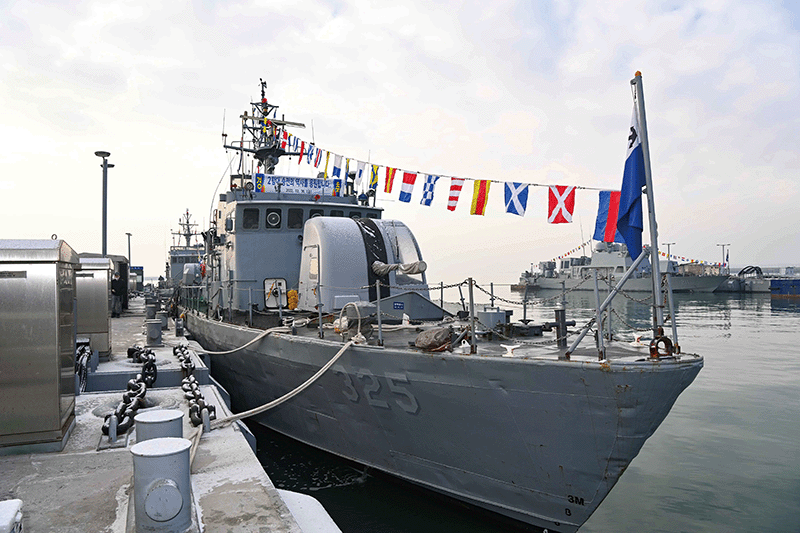
“내가 왜 국가유공자가 아니야.”
1996년 제1연평해전의 참전용사들이 25년 만에 국가유공자 지위를 거부당했다. 이유는 “의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난 3월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들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재심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재심사 이후에도 8명 전원이 아닌 4명만이 인정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비해당을 내린 사유로 당시 의료기록이 없고, 만기전역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신청했고, 의학 자문 결과로 해당 없음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궤변이다. 엄연히 당시 전투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장병에게 “멀쩡하게 직장을 다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국가보훈의 기준이 고통의 깊이가 아니라 서류의 두께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피는 증명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군인의 직무는 숭고하다. 그들이 없다면 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정부는 군인을 대우하기보단 방치한다. 장병들의 죽음은 그저 보고서 위 숫자일 뿐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군인의 목숨이 단순 행정 처리되는 문제에 있다. 이번 심사 때에도 참전용사들에게 구체적인 교전 상황을 반복적으로 추궁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보훈심사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교전 당시 기억을 반복 진술하도록 요구한 것은, PTSD를 겪는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전투를 강요한 것과 같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피흘려봤자 개죽음”이라 말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들의 이기심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면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가는 더이상 국민에게 피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조우진 편집국장
편집인: 김단비 부편집국장 (국어국문 21)
작성인: 조우진 편집국장 (국제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