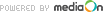한국외국어대학교 [르포] 낯섦 속에 떠밀린 1학기, 외대 새내기들의 ‘진짜 이야기’
이게 내가 꿈꾸던 대학생활이 맞나? 새터, 미팅, 엠티, 동아리. 25학번 새내기들이 입학 전 머릿속에 그렸던 대학생활은 어느 정도 현실이 됐다. 활동은 많았고 사람도 자주 만났다. 일정은 빽빽했고 하루는 빠르게 흘렀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족감은 좀처럼 따라오지 않았다. 얼굴은 익숙해졌지만 관계는 얕았다. 대학은 고등학교보다 훨씬 자유롭다. 시간표도 인간관계도 스스로 선택한다. 그 자유는 때론 방황을 낳는다. 정해진 틀이 없는 대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불안이 따라온다. 고등학교에서는 반 배정, 같은 수업, 유사한 생활 패턴이 관계의 뼈대가 됐다. 하지만 대학에선 수업도 다르고 동선도 겹치지 않는다. 같은 학과에 속해 있어도 얼굴을 마주칠 일은 드물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많아졌다. 관계는 만들어야만 생기는 것이 되었다. 1학기를 보낸 지금 많은 새내기들이 여전히 어색함 속에 있다. 익숙해지기보다는 적응 중이며 설렘보다는 혼란이 더 짙다. 기대와 현실 사이, 자유와 불확실성 사이에서 그들은 균형점을 찾고 있다. 필자는 외대 새내기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피를 잡아가는 대학생활의 단면을 들여다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