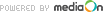*본 기사는 '2024 대학언론인 콘퍼런스: 불씨' 행사의 일환으로 기고된 전직 대학언론인 활동 수기입니다.

무덤덤해지는 상황은 두렵다. 이 때문에 대학언론에 투신했다.
스무 살, 평소와 다름 없이 오전 9시 강의를 듣기 위해 학교 셔틀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는 보통 강의 시작 3분 전쯤 도착했다. 나를 비롯한 차에 탄 사람들은 지각할까 제각기 강의실로 달려갔다.
분명히 학교 행정의 문제가 맞다. 학생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버스를 함께 탄 어느 이가 언성을 높이며 불만을 말하기 전까지는 이게 문제라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 이제껏 나 역시, 그 누구도 학교 측에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고는 소시민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대학언론을 시작한 계기다. 만물에 무덤덤해지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동아대학보 기자가 됐지만 모든 것이 어려웠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짓눌리던 나는 학업과 대외활동, 대학기자 활동을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
특히 학보 기자 활동은 기획 회의, 취재, 기사 작성, 조판이라는 사이클을 매달 반복하다 보니 가장 고된 일이었다. 이 시기를 지나 우리 손으로 만든 신문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일의 대가도 탐탁지는 않았다. 노동에 비해 활동비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문득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많았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해야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가다듬었다. 한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법인을 향해 민감한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학교가 그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을 때, 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노조 가입을 하니 학교 관계자가 고용 보장을 약속하며 노조 탈퇴 종용을 했을 때. 이 행태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언론 일을 4년간 하게 됐다. 기왕 이 일에 매진하는 만큼 기성언론 못지않은 기사를 쓰겠다는 태도로 임했다. 지금도 대학언론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주창하는, ‘우리의 독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의식했다. 독자는 당연히 대학구성원이다.
저널리즘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독자 니즈에 걸맞게 기사를 써야, 독자들이 제대로 읽지 않을지라도 우리 신문을 펼칠 기회가, 기사를 클릭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 단언했다. 대학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대학언론이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영향력이 커지면 권력기관인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언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학내 민주주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비민주적인 사립대에서는 더욱 절실한 일이다.

나 혼자, 동아대학보 하나로서는 지역 대학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명의 목소리보다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연대체를 만들었다. 2020년 부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를 결성한 것이다. 당시 부산 지역 대학언론 15곳이 모였다.
3년 동안 단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수확은, 미완의 과제로 그쳤지만 부산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대학 대상 시 기금을 대학언론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 과제를 후배 대학언론인들이 잘 이어가줬으면 바람이다.
어찌 됐든 대학은 떠나는 사회지만, 이 시기 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생업으로써 기자 일을 하는 건 대학언론 경험 덕이 크다.
내가 무덤덤하지 않고 모든 일에 대해 반추하는 건 대학언론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