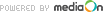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가장 큰 사회적 갈등으로 젠더 갈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갈등은 단순히 청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작용하고 있으며, 정치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시리즈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젠더 갈등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과연 젠더 이슈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을까?
젠더 갈등의 역사
일각에서는 젠더 갈등이 최근 부각된 현상으로 여기지만, 그 뿌리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젠더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였다. 당시 남성의 단독 생계 부양이 어려워지고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확대되면서 명확했던 성역할 규범이 해체됐다. 남녀 간 역할 구분이 모호해졌지만 성역할 인식이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다.
이어 1999년 군가산점 위헌 결정은 젠더 간 긴장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후 2010년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등장과 이에 대응한 페미니즘 커뮤니티 ‘메갈리아’, ‘워마드’의 출현은 온라인상에서 젠더 갈등의 양극화를 촉진했다.

2015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2018년 미투 운동과 혜화역 시위 등은 젠더 이슈를 정치권으로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됐다. 특히 이러한 젠더 이슈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20대 이하 남성의 72.5%가 오세훈 후보를, 여성의 44%는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며 성별에 따른 정치적 성향 차이를 분명히 보여줬다.
대선에서의 젠더 갈등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여성폭력방지법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20대 남성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정치적 보수화 현상을 낳았다.
2021년부터 국민의힘 유승민, 하태경 의원 등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보수 진영 내에서 젠더 이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점은 2022년 제20대 대선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며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20대 이하 남성의 58.7%가 윤 후보를, 여성의 58%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뚜렷한 성별 간 투표 성향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별 갈등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치권은 젠더 이슈를 어떻게 다루게 될까. 청년층이 느끼는 갈등을 해소하고 공감받는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지, 또다시 표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만 활용될 것인지 유권자의 주의 깊은 시선이 필요하다.
최민혁 기자(fhtsgy7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