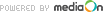취업 성공. 이것은 우리 대학생들이 매일 꾸는 꿈이다. 나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해 입사하는 순간, 마치 번데기가 기나긴 인내 끝에 나비가 되듯 나도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막연히 기대하며 오늘도 자기소개서를 쓰고 토익을 공부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신입사원이 됐다고 ‘나’라는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변할까. 사실 취직을 하고 보면 우리는 방금 캐릭터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끝날 줄 알았던 우리의 고민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며 매일매일 출근하고 퇴근한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신입사원의 모습 아닐까. 지금부터 이런 마음을 그대로 담은 신입사원의 일기를 살짝 구경해보자. 그리고 우리처럼 아직 고민이 많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솔직한 두 남자의 ‘신입사원 퇴근일지’.
* ‘신입사원 퇴근일지’는 실제 우리학교를 졸업한 선배님들이 솔직담백하게 작성한 일기로, 한 달에 한번 <외대알리>에서 연재됩니다. 사기업 마케팅부서와 언론계에 입사한 선배님이 각각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권혁일(언론정보 07)
: 2013년 10월 1일 호남지역 모 일간지에 수습기자로 입사
퇴근일지의 첫 장을 넘기며
‘언시 공부’가 그렇게 싫었다.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단 한 번도 언론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떨쳐본 적이 없건만, 그게 ‘언시 공부’에 대한 흥미로 이어지진 못했다.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해보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결국 한 번도 ‘언시 스터디’는 해보지 못했다. 뭘 해도 혼자서 하는 게 편하고, 낯선 사람에게 말 한 번 붙이기 힘들어하는 성격이라 그랬던 것 같다.
그게 2013년 9월이었다. 6학점짜리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던 무렵, 뭔가 해놓은 건 없고 마음만 달았다. 학점 관리는 꽤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스펙이었다. ‘스펙도 아니고 그냥 필수’라는 토익 점수도 엉망이었다. 몇몇 언론사는 일정 수준(보통 800점대 중반 정도)의 토익 점수를 ‘지원 자격’으로 걸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예 원서도 내볼 수 없었다.
뭔가 해야 했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들 아는 인터넷 카페의 채용정보방에서, 좀 이른 하반기 공채 공고들을 봤다. 다행히 글쓰기는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내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다. 인문관 한쪽 구석에 위치한 생활도서관에 틀어박혀 몇 장을 ‘생산’했다. 2013년 9월의 초반은 그렇게 지나갔다.
고향 지역의 유력(?) 일간지가 나를 뽑았다. 헐. 저… 저 말입니까? 회사는 내게 10월 1일부터 나오라고 했다. 이제부터 뭔가 구직활동을 시작해보던 차에, 그 구직활동이라는 것이 끝나버렸다. 세상에 이렇게 허무할 데가 있을까.
출근 첫날이었다. 오래 전에 맞춰서 이제는 잘 맞지도 않는 양복을 입고 출근했고, 사령장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했다. ‘본격적’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게는 첫 출근이었고, 첫 퇴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뭔가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뭐라뭐라 손가락을 꼬물거리며 짤막한 글을 썼고, 두 번째 퇴근하던 날에도 왠지 모르게 또 글을 썼고, 왠지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오늘도 썼다. 그리고 이제부터 공개할 글들이 그 결과물들이다.
Soorm(29)
: 2014년 4월 21일 S모기업 마케팅부서, 마침내 ‘급여적으로’ 정식사원 입사
퇴근일지의 첫 장을 넘기며
입사한지 106일 째, 수습기간이 끝났다.
이번 월급은 앞선 세 번의 월급과는 의미가 조금 달랐다.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정식 급여의 80퍼센트만을 받았었기 때문에, 급여통장에는 지난달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가 찍혀있었다. 물론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정식직원이 아닌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급여적으로도 정식직원이 되었다, 마침내.
수습기간의 마지막 퇴근길,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건넌다. 다리 위에서 넘실대는 한강을 보다보니 문득 며칠 전 여객선 사고로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고등학생들이 생각났다. 그들이 살고 싶어했던, 그리고 꿈꿨던 열아홉 이후의 십년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들이 꿈꿨던 대학생활을 했고, 또 그들이 꿈꿨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꿈꿨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나 자신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소망했던 십년을 나는 아무 의미 없이 소모하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이 스물아홉, 106일차 신입사원. 나는 지금 또 다른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