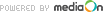밥,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루 세 번 밥을 먹는다. 꼬박꼬박 반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 행위에 우리는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그러므로 우리는 으레 먹고, 생각 없이 먹는다.
저자가 제시한 ‘밥도둑론(論)’은 이런 생각을 단번에 깨버린다. 밥도둑이라는 낱말만 보고 간장게장 같은 반찬 따위를떠올리면 오산이다. 물론 음식의 생김새나 레시피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다. 단지 시간 여행을 떠나기 위한 매개체일 뿐이다. 책을 통해 음식들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그는 지난날의 삶을 회고한다. 그는 음식들을 통해서군에서 벌였던 대담한 일들을 적었고, 해외로 추방당했을 때의 삶을 담았으며, 술 한 잔과 찌개 한 그릇을 통해 저승에간 막역한 친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것들의 토대 위에 그는 비로소 그가 쓴 것처럼 ‘음식은 사람 간의 관계이자 기억에 얹힌 촉매’이며, ‘진정한 밥도둑은 누군가와 나눠 먹는 맛임을 확인’하였다.
여태까지의 우리네 삶을 돌아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초등학교 시절, 실과 시간에 모둠을 짜서 얄궂은 음식을 해 먹었던 추억이 있고, 행여 스카우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뒤뜰야영 시간에 텐트 앞에서 궁상 떨며 밥을 지었던 경험도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덧 장성하여 대학에 들어온 그대는, 친구들과 식당으로 몰려가 난생 처음 보는 ‘소금구이덮밥’을 먹으며 ‘학식’의 신기원을 맛보기도 했을 터이다. 혹시 그대가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음식과 관련된 기억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칠흑 같이 어두운 밤에 보초를 서다가 들어와 전우와 함께 라면을 끓여먹은 일에서부터 무슨 큰 훈련이라도 있는 날에는 흙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반합에 얼마 되지도 않는 양의 밥과 반찬을 담아 한데모아 비벼 먹은 일까지.
이렇듯 우리는 20년 이상을 무념무상의 상태로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삶의 매 순간은 먹는 일과 맞닿아 있고 또 그 음식들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혼자의 행동이 아닌 다른 이들과의 연합하였을 때의 일이기도 하다. 수많은 식사에서 특별히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수히 많은 ‘너’와 함께 행해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먹는다는 것은 곧 수많은 ‘너’와의 기억을 공유해 온 것과 다르지 않다.밥도둑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필시 다른 이와 연합해야 하는 존재라는것을 깨닫는다. 우리가 앉을 식탁에 진수성찬이 차려질 필요는 없다. 밥 한 공기면 충분하다. 남은 공간은 너와 내가 채우면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또 하나의 삶의 기억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하되, 너와 함께 먹는 밥은참으로 나와의 연결고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