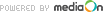글을 쓰기 시작하며…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나?
지방대 학보사는 조금 특별한 곳이다. 올바른 교내 문화 형성을 위해 학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비판의 칼날을 갈아야 하는 ‘교내 민주주의’의 대표적 상징이기도 하고, 지역 담론을 대학생의 시각에서 담아내는 특별한 곳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사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이다. 흔히 ‘이촌향도’, ‘서울 공화국’이라는 단어로 대체되는 쪼그라드는 지방의 현실답게 문화 형성 주도는커녕 학우들과 지역민들의 무관심뿐 아니라 대한민국 주류 사회에서도 잘 언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이 사실상 와해되고 있고, 지역 청년들의 사기와 자긍심 역시 추락하여 고꾸라진 채 방치된 지 오래다. 지방 대학의 언론인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변 지인들에게 호소하더라도 “쓸데없는 거 뭐하러 하노 군대나 가삐라” 같은 도움 안 되는 답변이 돌아온다. 부당한 처우를 해결하고자 학보사 차원에서 움직이면 일이 커져 '백지 발행' '편집국장 해고' 같은 대형사고(?)로 번지기에 늘 속으로 삭히거나 편집국 내부에서 서로 한탄하며 버티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방 대학 언론인들의 자세한 속 사정이나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를 성역 없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대학알리를 통해 솔직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또한 지역 담론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대 학보사 기자로서 잘 다뤄지지 않는 지방의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충을 나눠보고자 한다.
“학보사? 그게 뭐고” 지원부터 험난했던 대학 언론 생활
새내기 시절, 사범대학에 입학했으니 교사가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선배들과 교수님들에게 임용고시에 대한 정보를 막 얻고, 새로 만난 대학 친구들과 잘 지내보고자 고군분투하던 시기였다. 어느 날 동기들과 저녁을 먹고 학생회관을 지나가는데 한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우리 대학 학보사에서 수습기자를 모집한다는 포스터였다.
본래 사회 이슈나 시사에 관심이 많았기에 고등학교 시절 사회 과목에 흥미가 많았고, 이러한 흥미 덕분에 새내기 시절 ‘사회 교사’라는 진로를 정하게 된 나로서는 신문은 익숙한 매체였다. ‘신문? 수습기자?’ 포스터는 뇌리에 강하게 인식되었고, ‘교사’라는 진로를 수 년동안 꿈꿔왔음에도 수습기자에 지원하고자 했다. 나름 신문사에 입사하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생기부를 참고하며 자소서를 쓰고 있을 무렵, 주변 선배들에게 학보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적이 있다. 그래도 신문사에 입사하기 전에 학내에서 해당 기관의 여론이 어떠한지는 살펴봐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충격적 이게도 대다수의 선배들은 “학보사? 그게 뭐고?”, “뭐하는 곳인데?”와 같은 시큰둥한 반응이거나, 학보사의 존재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기들 조차 “또 자소서 써야 하는 거 아니가?”와 같은 자조 섞인 농담이 나왔다. 그 당시 새내기였던 나는 ‘그냥 저 사람들은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였지만 대학 언론인으로서 활동해오며 그때 주변 선배들의 반응이 주류 여론임을 실감했다.

“학내의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취재 보도를 하겠다!”
아무튼 주변 지인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학보사 입사 지원 서류를 제출했다. 며칠 뒤, 편집국장이 서류에 합격했으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했다. 면접장이 있는 편집국에는 이미 한 명의 지원자가 면접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 대기 장소가 마땅치 않아 편집국 밖 복도에서 마음 졸이며 초조하게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나름 면접이니까!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내가 심심해 보였는지 편집국 안에 있던 선배 기자 분이 성큼 나에게 걸어와 종이 뭉치를 건네주었다.
“이거 전국 대학 신문들인데 읽고 있을래요?” “감사합니다!” 넙죽 받은 뒤 복도에서 대학 신문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었다. 그간 기성 언론의 기사들은 수도 없이 많이 봐왔지만 대학 신문의 기사를 제대로 읽은 적은 부끄럽게도 면접 대기 당시가 처음이었다.
신기해하며 읽는 모습이 재밌어 보였는지 복도와 편집국을 왔다 갔다 하시던 선배 기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학과는 무엇인지, 어디서 사는지, 평소 신문에 관심이 많은지 등 가벼운 질문들이 대다수였지만 나에게는 사실상 1차 면접이었다. 그렇게 내 면접 순서가 다가왔고, 편집국장 앞에서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왜 학보사를 지원했는지 기본적인 면접 질문들이 오고 갔다. 면접은 꽤 길었고, 나름 긴장감 넘쳤다.
깐깐한 편집국장은 어떤 기사를 취재하고, 왜 취재하고 싶은지, 어떻게 취재할 건지 등 살벌하게 질문들을 밀고 갔다. 까다롭고 어려운 면접이었지만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들을 나름 관철하며 대답해 나갔다. 학내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 민의를 대표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이 내 소신이었다. 국장은 나의 소신에 반박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동조해주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나가려는데 대학 신문 뭉치를 건네줬던 선배 기자가 다가와 나에게 한마디 했다.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다를 거예요” 주변인들의 냉담과 선배 기자의 차가운 한마디 속에 대학 언론인의 생활을 시작했다.
김규민 (대구대신문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