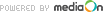음악에도 맛이 있다면
사람은 언제든 숨을 쉬어야만 하고, 노래를 들을 때도 예외일 수 없다. 침대에 눕거나 버스를 타거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찾아갈 때 언제나 노래를 듣는다. 나도 모르게 조금 벌린 입술 틈 사이로 숨과 함께 공기가 들어오고, 종종 어떤 노래들은 그 공기에도 맛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었다. <Lawns>를 어쩌다 발견했는지는 잊었지만, 이제 와 그런 건 별로 중요치 않지. 여전히 들을 때마다 처음 들은 순간 느꼈던 공기의 맛을 다시 본다. 씁쓸하게 고인 침을 삼키면 찾아오는 잠깐의 아릿한 달콤함, 그 위로 닿는 시원하고 그리운 향. 그 향이 조금 더 머무르길 바라서, 2년이 지난 지금도 <Lawns>를 듣는다. 마침내 하늘이 시원한 파랑이 된 어느 날. 기숙사 침대에 누우면 보이는 나무가 흔들렸고, 친구들과 작은 소풍을 떠났다.
좋은 맛은 슬픈 맛
음악을 글로 말한다는 건 어쩐지 어색한 일이다. 음표 자체가 마치 글자와 같은데, 번역이 필요 없는 언어를 굳이 번역하는 것 같다고 할까. 음악을 쓰기는 능력과 상관없이 그저 불가능한 일 같았다. 하지만 그래서 언제나 음악을 말해보고 싶고, 사람들은 어떤 음악에 슬픈 마음이 되는지 궁금하다. 가을은 여름에 생긴 슬픔들을 곱씹어 보는 시간이니까. 자신을 알아갈수록, 묻어뒀던 슬픔이나 잊기로 한 향을 다시 데려오는 소리나 이미지가 '좋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좋은 음악은 결국 슬픈 음악이다. 잊으려 했으나 잊지 못한, 혹은 잊지 않으려 했으나 잊은 모든 것이 슬프다. 그 슬픔을 알아차리게 하는 음악을 쓴다는 건, 말로는 설명하지 못한 슬픔을 설명하려는 어설픈 시도이고. 계절과 상관없이 슬픔에 대한 일은 언제나 어설프다. 그러니 이 글은 어찌해도 어설플 수밖에 없는 글이다.
잔디밭과 담배
<Lawns>는 칼라 블레이가 남긴 음악 중 가장 서정적인 축에 속하는 작품이다. 뉴욕의 재즈 클럽에서 담배를 팔며 재즈를 배우게 된 칼라는 아마도 담배 향을 가장 많이 맡았겠지. 훗날에는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어 작업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고 한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고정된 틀 속의 음악 교육을 거부하고 스스로 재즈를 배우러 나섰다. 그렇게 칼라는 1980~1990년대, 흔히 'free jazz'라고 하는 재즈의 역사를 만들었다. 당당하고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 찬 <Sextet> 앨범에서 <Lawns>는 파티 중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건처럼, 모든 걸 순간 정지시킨다.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피아노와 그를 받아내는 땅처럼 깊게 퍼지는 베이스 소리를 가만 듣다 보면, 어딘가 깊고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어진다. 선선하고 푸르른데 묘하게 슬픈 생각을 하게 되는 곳. 피아노, 오르간, 일렉 기타 두 대와 베이스, 그리고 퍼커션. 이렇게 여섯 개의 악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sextet', 육중주라고 부른다. 여섯 명의 연주자와 하나의 소리를 낼 때, 칼라는 지금 옆에 없는 누군가를 떠올렸을까? 그녀에겐 중요한 연인이 몇 명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의 성인 'Bley'를 죽을 때까지 사용했다. 어떤 풍경이나 향을 상상하며 이 곡을 썼을까? 아마도 칼라는 잔디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세대였을 것이다. 잔디밭에 앉아 위로 올라가는 하얀 연기를 보았을까? 그게 마치 떠나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을까?
<Lawns>는 가을 소풍 맛
소풍을 떠날 때만 해도, 난 비흡연자였다. 작은 소풍은 학교 뒷마당에서 열렸다. 계절은 우리에게 반소매 윗옷과 긴 바지를 허락했다. 당신이 입었던 연보라색 바지, 또 당신이 입었던 흰 블라우스가 기억난다. 귀엽고 서툰 도시락을 싸서, 모든 게 떨어지기만 하는 나무들 밑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사진을 찍었다. 소풍이 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벚꽃이 다 떨어질 즘이던 것 같기도 하다. 사진을 다시 꺼내 볼 용기가 부족해서, 소풍은 슬픈 일로 남았다. 우리는 더 이상 함께 밥을 먹지 않고, 계절을 맞이하지 않고, 노래를 듣지 않는다. 나는 그 소풍을 잊으려 했고, 실제로 얼마간은 잊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Lawns>를 들을 때면 꼭 그 소풍이 떠오른다. 우리가 잔디밭에 누워볼 수도 있었을까. 이 노래를 같이 들어볼 수도 있었을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단순히 옆에 있는 걸 넘어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었을까. 잊으려 했으나 잊지 못한 시간, 헤아리려 했으나 영영 알 수 없게 된 친구들의 마음이 떠오르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봄과 가을은 아주 짧고 달콤하게 지나가버린다는 점에서 닮았다. 한쪽은 다시 시작하고, 한쪽은 모두 끝낼 준비를 하는 시간이란 양극성에도 불구하고.
칼라와 남편인 베이시스트 스티브 둘이 연주하는 라이브 영상을 보며, 이런 음들을 공유하며 호흡을 맞춰 연주한다는 건 어떤 걸까 상상해본 적이 있다. 나는 여전히 친구들이 떠난 학교에 남아 <Lawns>를 들으며, 우리가 누워보지 못한 잔디밭의 맛을 본다. 혼자서는 영영 헤아릴 수 없는 그 맛을.
글 : 상서
편집 : 윤영우 기자, 주미림 기자
디자인 : 윤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