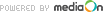■ 학기가 끝날 때마다 날아오는 익숙한 장문의 ‘카톡’
‘2019-2학기’ 종강을 마친 지난 2월 겨울방학에 일어난 이야기이다. 우리 학보사는 방학 기간에도 기사를 몇 번씩 내기에 종강을 하더라도 수습기자와 정기자들이 종종 연락을 하곤 한다. 그런데, 한 수습기자 친구에게 ‘카톡’이 날아왔다. 방학에 발간하는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겠거니 하고 ‘카톡’을 확인해보았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신문사를 더 이상…”으로 이어지는 장문의 ‘카톡’이었다. ‘카톡’ 창에 뜨는 그 친구의 메시지에 가슴이 덜컹했다. ‘역시 이번에도 그만두겠다는 연락이겠구나’. 예상은 적중했다. 신문사 업무가 생각보다 힘들고, 사정이 어려워 신문사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메시지였다. 고민했을 후배에게 참 미안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신문사 후배를 떠나보냈다. 종강을 마치고, 아니면 방학 도중 수습기자들이 보내는 장문의 ‘카톡’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항상 그들이 던지는 화두는 나의 오랜 고민거리이다.
우리 학보사는 보통 한 학기 정도 수습기자 과정을 거친 뒤, 정기자로 승진 임명되는 형식의 인사 체계를 가지고 있다. 4개월 남짓 되는 정규 학기 동안 수습기자 직함을 달고 활동을 하면 정기자가 되어 기자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는 형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4개월 남짓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신문사 활동을 그만두는 수습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내가 신문사에 입사한 2018년 3월 이후, 약 5학기 동안 수습기자 활동을 마치고 정기자로 승진 임명되는 인원 수가 다섯 손가락이 안된다. 심지어 어떤 학기에는 당시 입사한 수습기자 전원이 정기자 직함을 달지 못하고 편집국 일원이 되기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 수습기자들의 중도 탈락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 수습기자 중도 탈락 심해지니 편집국 내부도 ‘비상’
이렇듯 수습기자들의 중도 탈락이 속출하니 편집국 내부에 있는 정기자들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편집국 정기자들의 업무가 많은데 후임 양성이 불투명 해지니 항상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자신들이 신문사를 그만두어도 마땅히 일할 인력이 없으니 조직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정기자와 수습기자들이 합작 기사를 통해 편집국 일원으로서 함께한 나름의 작업 기간이 있는데 수습기자들이 그만둬버리니 섭섭함을 드러내는 기자도 있었다.
그들도 아마 나와 같이 수습기자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순간이 익숙했겠지만 항상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결국 편집국 내 정기자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왜 많은 수습기자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우리 편집국을 떠나는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기사 관련 회의 이외의 별건(別件)으로 공식적인 내부 회의가 소집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 그간 그만둔 수습기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정기자들의 수습기자 시절 등을 떠올리며 나름 내린 중도 탈락 원인은 크게 몇 가지 나뉘었다.
■ 기자들끼리 모여서 해결책 나름 ‘심사숙고(深思熟考)’ 했지만
첫째, 우선 신문사 업무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은 비교적 인력난이 심한 우리 편집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수습기자들이 신문사에 입사해서 바로 기사 작성, 취재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업무가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기자 생활에 적응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신문사 업무가 버거우니 당연히 이 같은 어려움은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처음 해보는 취재원과의 취재 과정, 기사 작성, 사수 선배 기자와의 불편한 연락 등 적응을 쉽게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제약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회의감. 즉, 노력한 결실에 비해 마땅한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지방대학의 학생자치에 대한 무관심 기조 심할수록 더 도드라지는 현상이다. 선출 세력인 학내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학내 이슈에 대해서도 학우들이 덤덤해질 수밖에 없다. 학내 이슈를 최일선에서 짚고 다루는 학생 언론이 외면받는 것은 당연하다. 각종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기사를 썼지만 독자의 피드백, 학우들의 관심이 사실상 전무(全無) 하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넷째, 신문사의 위계질서 문제이다. 여전히 학보사는 기수제로 운영되고, 직급 체계가 존재하는 등 선후배 관계가 명확하다 보니 이것이 수습기자들에게 있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기자와의 합작 기사 작성 과정, 사수 선배와의 업무 이야기에서 선후배 위계가 느껴지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보사 업무는 공식적인 업무다 보니 학생 신분이 아닌 교수, 교직원들과 연락하며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것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의 사례들이 우리 편집국 내 정기자들이 공통되게 내린 큼직한 원인들이었다.
평소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학보사 기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우리 학보사의 수습기자 중도 탈락이 너무 심하니 좋은 묘안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부탁도 했었다. 지방대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인 아는 누나는 우리 학보사의 상황을 의아하게 보기도 했다. 본인 경험상 수습기자가 중도에 나가는 경우는 업무 미숙으로 평가 과정에서 해임되거나, 학생회 이중 겸직 문제 말고는 스스로 힘들어서 수습 기자직을 그만두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 업무의 결이 다르긴 하나, 평소 알고 지내는 우리 대학 영자신문사 기자도 “보통 수습기자들이 업무 평가를 거친 뒤 해임되는 경우 말고 스스로 그만두는 사례가 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국자 신문사는 늘 힘들다고 그만두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 수습기자 중도탈락은 결국 대학언론의 전반적 문제로 직결
만약 수습기자들의 중도 탈락이 심한 경우가 우리 편집국에만 국한된 문제라면 이는 나를 포함한 정기자들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나의 인맥이 넓지 못해 여러 학보사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좋은 방안을 제안받지 못해 더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수습기자들의 중도 탈락 문제는 우리 학보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넘어 본질적으로 대학 언론 자체의 어려움도 포함하기에 아무리 고민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존재한다.
그래도 이번 학기에 선발된 수습기자들에게 첫 취재를 다녀오고, 기사를 쓴 소감을 묻자 대부분 “괜찮았다”, “재밌었다”고 대답했다. 편집국 내 정기자들이 후임 양성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인지 수습기자들을 더 많이 챙기려 하고, 기사 할당량을 조절해주는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학보사 업무가 단순히 재밌으면 안 되겠으나, 이전과 달리 수습기자들이 학보 업무에 흥미로워하고,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눈에 띄어 다행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이 친구들도 언젠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
김규민 (대구대신문사 편집국장)
<지방대 학보사 기자로 살아남기> 시리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