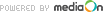[편집자주] 해당 기고문은 필자의 요청에 따라 가명으로 게재됩니다.
당돌하게 쫓겨나기
“수습기자 OOO입니다. 경찰서 도착해 출근 보고드립니다”
인사는 짧았고 지시는 명료했다. 아홉 시까지 관할 경찰서 당직실을 돌아다니며 간밤에 있었던 특이동향을 알아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한 곳에서 이야기가 길어질 경우 충분히 시간을 쓰라고도 덧붙였다.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고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답이 나오지 않았다. 직접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었다. 정확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우선 내가 있는 A 경찰서의 형사당직실로 향했다.
형사당직실은 이중 보안 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민원인을 위한 빨간 호출 버튼이 문 오른쪽 아래편에 달려 있었다. 크게 한번 심호흡한 후 버튼을 누르자 사복을 입은 당직 형사가 문을 열고 나타났다. 밤을 새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그는 나를 민원인이라 생각했는지 애써 친절한 미소를 띤 채 어떤 일로 찾아왔냐고 물었다.
“오늘 처음 온 OO 신문 기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간밤에 별다른 사건 없었는지…”
“예? 아무 일 없고요. 나가세요”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팀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나가시라고요“
멍청한 질문이었다. 경찰들은 대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기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마와리가 끝나면 얼굴 볼 일도 없으면서 불쑥 나타나 아는 체하는 신입 기자는 더더욱 싫어한다. 아무런 정보도 경험도 없는 내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다. 그는 아침부터 재수 옴 붙었다는 듯 손짓을 하며 나를 내쫓았다. 황당했지만 기분 나쁜 티를 낼 수 없었다. 당장의 보고를 떠나 앞으로 매일 와야 할 곳이기 때문이었다.
자동문이 미처 닫히기 전 그에게 명함을 쥐여주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는 마뜩잖은 표정으로 내 명함을 받아 책상 어딘가에 대충 던졌다. 망연자실한 채 형사당직실을 빠져나오는 내게, 피곤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두드리던 바로 그 또래 남자가 은은한 미소를 띤 채 내게 말을 걸었다.
”기자시죠? 저도 OO신문 신입 기자입니다. 여기 형사당직실 뚫기가 쉽지 않아요.“
알고 보니 그는 나보다 한 달 앞서 마와리를 시작한 타 언론사 신입 기자였다. 그는 자신 역시 형사당직실에 들어가 정보를 캐내려 노력했지만 빈번히 실패했다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에게서 묘한 유대감이 느껴졌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했다. 마와리 선배인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다. 서둘러 택시를 타고 B 경찰서로 향했다.
비굴하게 쫓겨나기
B경찰서는 바로 직전의 A경찰서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출입증을 찍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로비 바리케이트 바로 옆에 경찰관이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가 신입 기자임을 밝히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약속을 잡고 오지 않았다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는 최대한 불쌍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꼭 들어가야 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직실 형사분들께 간단히 인사만 드리고 오겠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진짜 곤란한데... 정 그렇다면 인사만 드리고 바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는 나보다 고작 몇 살 정도 많아 보였다. 동생뻘인 내가 안쓰러웠는지, 내게 출입증을 건네주며 낮은 목소리로, 볼일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나올 것을 당부했다. 마음이 급했다.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형사당직실이 위치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하는 순간,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배불뚝이 경찰이 뒤에서 나를 다급히 불러 세웠다.
“잠깐만, 누구세요?”
“아, 저는 신입 기자인데,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
“기자요? 얼쩡거리지 말고 나가세요. 여기 그렇게 막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닙니다”
“정 그렇다면 로비에 앉아만 있다 가겠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출입증 반납하고 당장 나가세요”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로비를 울렸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내게 집중됐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순간 눈물이 찔끔 나올 만큼 서러웠다. 그러나 보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기죽거나 우울해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 바이스에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고 말할 용기는 더더욱 없었다. 지체 없이 이동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왔다.
웃는 낯에 침 뱉으며 쫓겨나기
헐레벌떡 택시를 타고 마지막 C 경찰서로 향했다.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막혀 이동 시간을 지체한 탓에 보고까지 30분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작전을 바꿔 인근 편의점에서 박카스를 몇 병 샀다. 웃는 낯에는 침 못 뱉는다는 오랜 격언을 따라, 빙글빙글 웃으며 능글맞게 들이대 볼 생각이었다. 다행히 C경찰서는 오가는 기자를 막지 않았다. 덕분에 무사히 형사과장실 문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네, 하고 대답하는 형사과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문을 열었다. 형사과장은 40대 후반 정도의 남성이었다. 나는 걸어 들어가 그의 책상에 불쑥 박카스를 올려놓았다. 어리둥절해하는 그에게 “불철주야 고생 많으시온데” “송구하오나 저는 이러한 사람이며” “앞으로 매일 올 테니 잘 부탁드리겠다”며 아양을 떨었다. 다행히 그도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작전은 성공한 듯 보였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내게 딱 오 분 정도 시간을 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수많은 수습기자를 봐온 탓인지, 그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내게 무슨 사건의 어떤 정보를 알고 싶냐고 물었다. 아는 대로 대답해 주겠다고도 덧붙였다. 형사과장의 그 한마디에 내쫓겨 다녔던 지난 두 시간의 서러움이 씻겨 나가는 듯한 상쾌함이 느껴졌다. 물론 오늘이 내 마와리 첫날이고, 따라서 나는 사건이고 나발이고 아는 게 쥐뿔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서 물어봐요. 아는 대로 대답해 줄 테니까”
“아...그게.....간밤 특이 동향이라거나...”
“나 참..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보면 누가 대답해 줄까요?”
“예?”
내가 생초보라는 사실이 까발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김이 빠졌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직접 취재한 내용도 없으면서 다짜고짜 와서 사건을 알려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충고의 요지였다. 뭐든 좋으니 취재를 하고 다시 오라며 그가 손으로 문 방향을 가리켰다. 결국 형사과장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마와리 첫날 첫 지시, 두 시간 동안 내가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보고 시간이 다가왔다.